後日談 :: 驟雨不終日
<center><iframe src=" width="300" height="5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center>
<center><img src='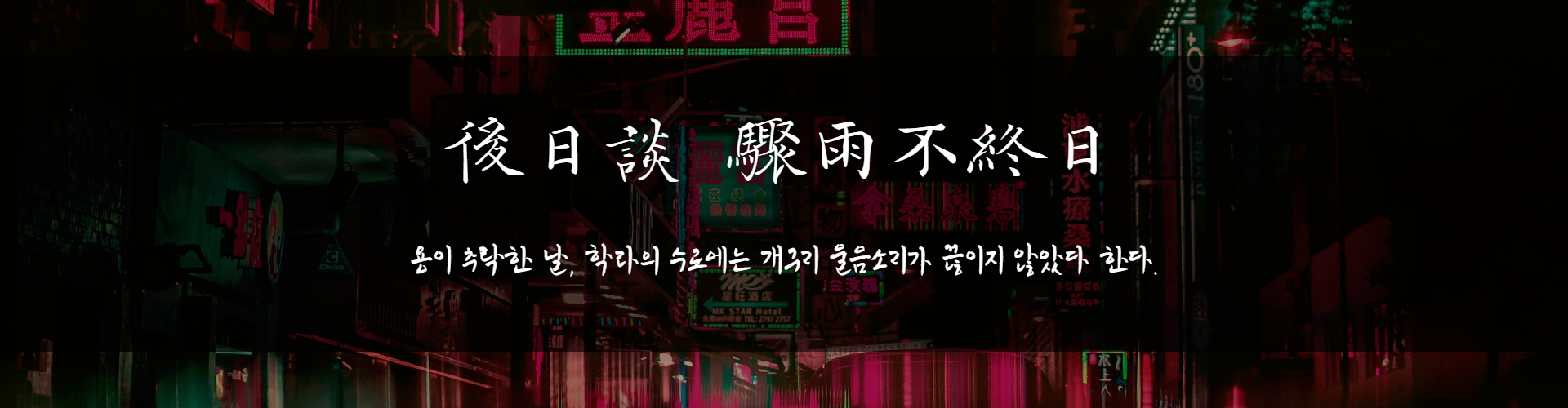 '
'
alt='img.jpg'
class='content-image'
style='max-width: 100%; width: fit-content; height: auto;'></center>
가슴 언저리며 가게 문가에 내걸렸던 새하얀 꽃이 하나, 둘 떨어져 오랜 지주를 보내고, 서편으로 기운 해가 밤을 내달려 새로운 날을 열었다. 수많은 욕망과 파란의 흔적은 높은 담장과 두꺼운 문 안쪽에 갇힌 채 묵묵하였으나 소문이란 발 없는 말과도 같은 존재라. 희미한 틈새로 새어 나온 용의 추락은 일주야도 버티지 못한 채 뒷골목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뿐이랴. 학라의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기까지는 고작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더란다. 사흘 전 실린 장 대인의 부고에 이어 황룡회 후계자의 행방불명과 산주의 부재 소식이 실린 신문은 연일 어둠 속에 숨은 진실 앞에 의문과 추측을 남겼으나 누구도 굳게 다물린 입을 열지 못했을 테다.
잉크 냄새가 물씬 풍기는 종이 뭉치를 반으로 접어 테이블에 던진 염오는 녹슨 창살이 쳐진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늘하고 눅눅한 공기가 침잠한 정신을 일깨웠다. 폐를 한껏 부풀려 비린내 없는 신선한 공기를 담는다. 이따금 먼 곳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리는 거세지 않은 빗방울이 온 땅을 적신탓에 사람 한 명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스산한 물의 도시가 무덤처럼 고요하다. 하기야 이 땅의 주인이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니, 그와 다를 바 없음을 부정하지 못하리라. 단 하나 유감스러운 사실이 있다면 그 주인 될 예정이었던 자는 계획과 달리 죽지 않았고, 지금 제 옆에 놓인 침대에서 약 기운에 잠들어 있다는 점이겠지만.
즉위식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암살, 사고, 행방불명, 조직 내 반역. 화두에 올린 사람 수만큼 추측과 의심이 호사가들의 입에 올랐으나 크고 작은 풍문 중 그럴듯한 진상에 도달하는 자는 없었다. 그날, 거짓과 배신이 난무한 무대 위에서 용이 되려는 자와 용을 떨어뜨리려던 자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수로를 내달려 뒷골목 어디로 향했는지도.
천운이 따른 모양인지 귀 염오와 라 하현은 목숨을 부지했다. 거미줄 같은 골목을 돌고 돌아 병원을 발견하기까지 일분일초가 얼마나 길었던가. 숨을 돌리는 동안에도 추격자가 나타날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나 황룡회와 광신자 집단은 몸을 웅크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다 할 동태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새까만 수로 밑에 가라앉힌 것 마냥 문은 열리는 일 없이 고요했다. 언제까지 평온을 가장할지 알 수 없으나 놓쳐선 안되는 때 임은 확실했다. 뒤늦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깊이 머금었던 숨을 뱉었다.
큼직한 손이 잠든 이의 이마를 덮는다. 호흡 고름. 열없음. 혈색도 나쁘지 않군. 고집과 정신력만큼 목숨도 질긴 건지 하현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조금만 더 늦었거나 체온이 더 떨어졌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지만 염오는 황룡회의 추락한 용이 이리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리 없다 생각했다. 그리도 대범한 자가 어처구니없이 죽는다면 퍽 우스꽝스러운 꼴이지 않겠는가. 나른히 풀린 입매와 곱게 펴진 미간을 응시한다. 잠결에 부스스해진 머리칼을 정돈해주자 한결 그다운 모습이 드러났다. 거만함이 씻겨내려간 낯짝과 마주하니 자신이 알던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다가도 서로를 죽고 죽이기 위해 손을 맞잡아 목숨을 부지했다는 모순이 떠올라 입술 사이로 조소가 기어 나왔다. 그러나 어거지로 조각을 끼워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래였음을 염오는 이해한다. 만약 그가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운을 띄웠을 테지.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는 건 뒷세계에서 흔한 일이며, 그도 자신도 목숨을 내버릴 생각이 없었으니까. 필요하다면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웃는 게 이 세상의 순리였다. 그렇기에 귀 염오는 자신이 걸린 덫을 불쾌히 여길지언정 분개하지 않았다. 약하고 가진 게 없다면 이용당하고 잡아 먹힌다. 당한 놈의 불찰을 누구에게 따지랴. 자기 몸에 칼을 박는 꼴이다. 사람을 장기 말로 쓸 수 있다면 자신이 장기 말이 될 각오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한 번 목줄을 매였다고 영원히 타인의 손에 휘둘리라는 법 또한 없으니, 두 번은 존재할 수 없으리라. 귀 염오는 라 하현의 거래에 응했으나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아니, 결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뱀처럼 간사한 남자. 웃으며 상상조차 못 할 그림을 그려 실행하는 자. 그런 속내 모를 인간이 자기 죽음을 순순히 내어주겠다 호언장담할 리 없다. 염오는 그를 알기에 확신한다. 라 하현은 거래를 빌미로 자신을 이용하고 버리던가 그 전에 처리할 거라고. 이리 회의적인 결론은 내리지만 결론적으로 나쁜 거래는 아니었다. 그가 자신을 이용하듯, 자신도 그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탐욕은 끊임없이 아귀를 벌려 주변을 삼키고 양분삼으니, 마지막에 그 추악함을 딛고 일어나 선연한 욕망을 피우며 웃는 하나가 남을 것이다. 그래. 용이 다시 승천할 그날에. 소나기는 곧 그칠 테니.
그러니 라 하현. 당신은 결코 내 손에서 죽어야만 해. 웃는 건 내가 되어야 하니까. 반듯한 입술이 내뱉은 중얼거림은 한 없이 작고 가벼웠던 탓에 금세 눅눅한 바람에 뒤섞여 흩어졌다.
그로부터 닷새 뒤 륭현(㚅縣). 염오의 수족 중 하나에게 전보가 도착했다. 그가 짤막한 종이 한 장의 출처를 조사할 무렵, 이미 붉은 머리칼의 사냥꾼과 검은 이무기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뒷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center><i>龙的坠落,不知何歲月。</i></center>
<center>避开龙的血脉。回归不明。</i></center>
<center><img s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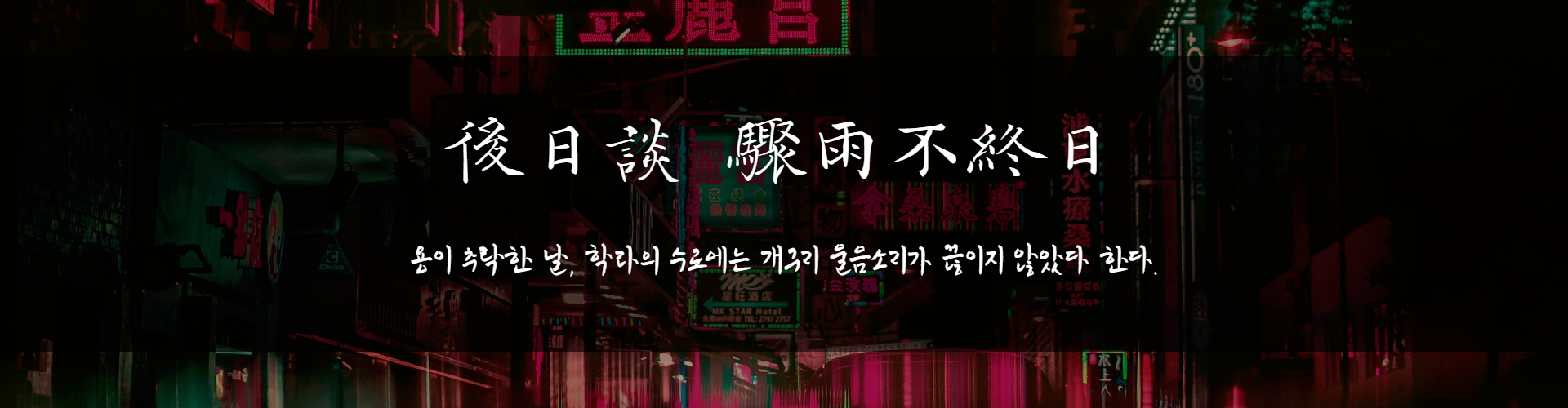 '
'alt='img.jpg'
class='content-image'
style='max-width: 100%; width: fit-content; height: auto;'></center>
가슴 언저리며 가게 문가에 내걸렸던 새하얀 꽃이 하나, 둘 떨어져 오랜 지주를 보내고, 서편으로 기운 해가 밤을 내달려 새로운 날을 열었다. 수많은 욕망과 파란의 흔적은 높은 담장과 두꺼운 문 안쪽에 갇힌 채 묵묵하였으나 소문이란 발 없는 말과도 같은 존재라. 희미한 틈새로 새어 나온 용의 추락은 일주야도 버티지 못한 채 뒷골목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뿐이랴. 학라의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기까지는 고작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더란다. 사흘 전 실린 장 대인의 부고에 이어 황룡회 후계자의 행방불명과 산주의 부재 소식이 실린 신문은 연일 어둠 속에 숨은 진실 앞에 의문과 추측을 남겼으나 누구도 굳게 다물린 입을 열지 못했을 테다.
잉크 냄새가 물씬 풍기는 종이 뭉치를 반으로 접어 테이블에 던진 염오는 녹슨 창살이 쳐진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늘하고 눅눅한 공기가 침잠한 정신을 일깨웠다. 폐를 한껏 부풀려 비린내 없는 신선한 공기를 담는다. 이따금 먼 곳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리는 거세지 않은 빗방울이 온 땅을 적신탓에 사람 한 명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스산한 물의 도시가 무덤처럼 고요하다. 하기야 이 땅의 주인이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니, 그와 다를 바 없음을 부정하지 못하리라. 단 하나 유감스러운 사실이 있다면 그 주인 될 예정이었던 자는 계획과 달리 죽지 않았고, 지금 제 옆에 놓인 침대에서 약 기운에 잠들어 있다는 점이겠지만.
즉위식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암살, 사고, 행방불명, 조직 내 반역. 화두에 올린 사람 수만큼 추측과 의심이 호사가들의 입에 올랐으나 크고 작은 풍문 중 그럴듯한 진상에 도달하는 자는 없었다. 그날, 거짓과 배신이 난무한 무대 위에서 용이 되려는 자와 용을 떨어뜨리려던 자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수로를 내달려 뒷골목 어디로 향했는지도.
천운이 따른 모양인지 귀 염오와 라 하현은 목숨을 부지했다. 거미줄 같은 골목을 돌고 돌아 병원을 발견하기까지 일분일초가 얼마나 길었던가. 숨을 돌리는 동안에도 추격자가 나타날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나 황룡회와 광신자 집단은 몸을 웅크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다 할 동태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새까만 수로 밑에 가라앉힌 것 마냥 문은 열리는 일 없이 고요했다. 언제까지 평온을 가장할지 알 수 없으나 놓쳐선 안되는 때 임은 확실했다. 뒤늦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깊이 머금었던 숨을 뱉었다.
큼직한 손이 잠든 이의 이마를 덮는다. 호흡 고름. 열없음. 혈색도 나쁘지 않군. 고집과 정신력만큼 목숨도 질긴 건지 하현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조금만 더 늦었거나 체온이 더 떨어졌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지만 염오는 황룡회의 추락한 용이 이리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리 없다 생각했다. 그리도 대범한 자가 어처구니없이 죽는다면 퍽 우스꽝스러운 꼴이지 않겠는가. 나른히 풀린 입매와 곱게 펴진 미간을 응시한다. 잠결에 부스스해진 머리칼을 정돈해주자 한결 그다운 모습이 드러났다. 거만함이 씻겨내려간 낯짝과 마주하니 자신이 알던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다가도 서로를 죽고 죽이기 위해 손을 맞잡아 목숨을 부지했다는 모순이 떠올라 입술 사이로 조소가 기어 나왔다. 그러나 어거지로 조각을 끼워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래였음을 염오는 이해한다. 만약 그가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운을 띄웠을 테지.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는 건 뒷세계에서 흔한 일이며, 그도 자신도 목숨을 내버릴 생각이 없었으니까. 필요하다면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웃는 게 이 세상의 순리였다. 그렇기에 귀 염오는 자신이 걸린 덫을 불쾌히 여길지언정 분개하지 않았다. 약하고 가진 게 없다면 이용당하고 잡아 먹힌다. 당한 놈의 불찰을 누구에게 따지랴. 자기 몸에 칼을 박는 꼴이다. 사람을 장기 말로 쓸 수 있다면 자신이 장기 말이 될 각오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한 번 목줄을 매였다고 영원히 타인의 손에 휘둘리라는 법 또한 없으니, 두 번은 존재할 수 없으리라. 귀 염오는 라 하현의 거래에 응했으나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아니, 결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뱀처럼 간사한 남자. 웃으며 상상조차 못 할 그림을 그려 실행하는 자. 그런 속내 모를 인간이 자기 죽음을 순순히 내어주겠다 호언장담할 리 없다. 염오는 그를 알기에 확신한다. 라 하현은 거래를 빌미로 자신을 이용하고 버리던가 그 전에 처리할 거라고. 이리 회의적인 결론은 내리지만 결론적으로 나쁜 거래는 아니었다. 그가 자신을 이용하듯, 자신도 그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탐욕은 끊임없이 아귀를 벌려 주변을 삼키고 양분삼으니, 마지막에 그 추악함을 딛고 일어나 선연한 욕망을 피우며 웃는 하나가 남을 것이다. 그래. 용이 다시 승천할 그날에. 소나기는 곧 그칠 테니.
그러니 라 하현. 당신은 결코 내 손에서 죽어야만 해. 웃는 건 내가 되어야 하니까. 반듯한 입술이 내뱉은 중얼거림은 한 없이 작고 가벼웠던 탓에 금세 눅눅한 바람에 뒤섞여 흩어졌다.
그로부터 닷새 뒤 륭현(㚅縣). 염오의 수족 중 하나에게 전보가 도착했다. 그가 짤막한 종이 한 장의 출처를 조사할 무렵, 이미 붉은 머리칼의 사냥꾼과 검은 이무기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뒷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center><i>龙的坠落,不知何歲月。</i></center>
<center>避开龙的血脉。回归不明。</i></center>
- 이전글後日談 :: 海上散步 25.11.09
댓글목록
댓글
승철이 @slow25